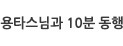딱새에게 보내는 편지
동쪽 숲이 아침 햇살로 막 물들기 시작하는 시간. 높은 나무에 작은 새들이 한 쪽 방향으로 조로롱 앉아있다. 밤새 떨며 자다가 따스한 햇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가슴 아릿하면서도 사랑스럽다. 겨울이 되면 작은 새들은 종족이 달라도 서로 무리를 지어 다닌다. 함께 다니면 먹이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한뎃잠을 견디어 낼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벌레가 주식인 딱새는 무리 지어 다니는 일이 없다. 겨울에는 작은 열매도 먹기는 하지만 아무튼 딱새는 천성이 외로운 사냥꾼이다. 그런데 이 꼬마 사냥꾼은 참 기특한 일을 한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옆집 처마 밑으로 딱새가 부지런히 들락거린다. 그런데 그 집 툇마루에 뻐꾸기 녀석이 앉아 있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망원경으로 살폈다. 뻐꾸기가 처마 아래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몇 개의 알을 물고 나온다! 그러고는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알을 연거푸 통째로 삼킨다! 뻐꾸기 눈알이 번뜩인다. 제 몸뚱이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딱새네 둥지에 숨어들어 도둑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딱새 알은 모조리 먹어치운다. 딱새는 알을 빼앗긴 위에 그 ‘원수’의 새끼를 기르느라 온갖 수고를 다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만행이 용인되고 있는 곳이 생태계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니 뻐꾸기의 ‘뻔뻔한’ 짓은 사람이 분개하듯 그런 범죄는 아닐 것이었다. ‘탁란’이라는 번식 방법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리가, 이어져 왔을 수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우주는 138억 년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광대무변한 세계가 탄생되고, 지구 위에는 그토록 다양한 생명들이 평등하게 번성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바로 연기라는 상생(相生)의 이치이다. 그러하니 뻐꾸기와 딱새 사이에도 분명 어떤 상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실체사고에 젖어 비(非)상생적인 생존방식에 길들어온 탓에 상상력이 빈약해져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뿐이리라. 작은 새들은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그 덕분에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너끈히 살아간다. 그래서 가끔씩 뻐꾸기 새끼를 길러주면서 강한 모성애가 종족의 과잉번식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포로롱, 딱새가 날아간다. 연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작은 새야. 너는 사랑 가득한 우주 질서의 현현이려니. 연기의 꽃밭에서 만난 작은 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상생의 이치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렴. 때로는 내가 너 되고, 때로는 네가 나 되어, 너와 함께 이 연기의 꽃밭을 살아가리니. 이 겨울,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구나. 이 가슴 평화로 충만하구나.

어느 해 여름이었다. 옆집 처마 밑으로 딱새가 부지런히 들락거린다. 그런데 그 집 툇마루에 뻐꾸기 녀석이 앉아 있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망원경으로 살폈다. 뻐꾸기가 처마 아래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몇 개의 알을 물고 나온다! 그러고는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고 알을 연거푸 통째로 삼킨다! 뻐꾸기 눈알이 번뜩인다. 제 몸뚱이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딱새네 둥지에 숨어들어 도둑 알을 낳는다. 그리고는 딱새 알은 모조리 먹어치운다. 딱새는 알을 빼앗긴 위에 그 ‘원수’의 새끼를 기르느라 온갖 수고를 다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만행이 용인되고 있는 곳이 생태계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니 뻐꾸기의 ‘뻔뻔한’ 짓은 사람이 분개하듯 그런 범죄는 아닐 것이었다. ‘탁란’이라는 번식 방법이 일방적인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리가, 이어져 왔을 수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우주는 138억 년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광대무변한 세계가 탄생되고, 지구 위에는 그토록 다양한 생명들이 평등하게 번성할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바로 연기라는 상생(相生)의 이치이다. 그러하니 뻐꾸기와 딱새 사이에도 분명 어떤 상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었다. 다만 우리 인간은 실체사고에 젖어 비(非)상생적인 생존방식에 길들어온 탓에 상상력이 빈약해져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뿐이리라. 작은 새들은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다. 그 덕분에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너끈히 살아간다. 그래서 가끔씩 뻐꾸기 새끼를 길러주면서 강한 모성애가 종족의 과잉번식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포로롱, 딱새가 날아간다. 연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작은 새야. 너는 사랑 가득한 우주 질서의 현현이려니. 연기의 꽃밭에서 만난 작은 새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상생의 이치를 결코 잊지 않게 해주렴. 때로는 내가 너 되고, 때로는 네가 나 되어, 너와 함께 이 연기의 꽃밭을 살아가리니. 이 겨울,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답구나. 이 가슴 평화로 충만하구나.